 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나눈 간단하고 날카로운 대화는 이 말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준다.
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나눈 간단하고 날카로운 대화는 이 말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준다.벤처기업 지원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논의하던 자리에서 대통령이 “민간이 주저할 때 공공이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자, 권 부위원장은 곧바로 “재정을 조금만 보태면 금융권에서 10~20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라고 응수했다. 대통령이 “얼마나?”라고 묻자 “5000억 원”이라는 답이 즉각 튀어나왔다. 짧은 대화가 곧 정책 설계와 실행으로 연결된 순간이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대통령 앞에서도 주저 없이 의견을 밝히며 금융권의 이목을 끌었다. 언론이 주목한 ‘케미’ 덕분에 그는 단순한 실무 관료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그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파견과 윤석열 인수위 참여 이력은 진영 논리로 발목을 잡힐 수도 있었다. 현 정부에서는 과거가 아닌 권 부위원장의 현재를 봤고, 성과 중심의 ‘실용 인사’를 보여줬다.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 ‘주담대 규제 강화 설계자’로 지목된 뒤, 불과 보름 만에 사무처장에서 부위원장으로 직행한 사례는 이를 상징한다. 금융위원회 역사에서 사무처장에서 곧바로 부위원장으로 오른 것은 2017년 김용범닫기
 김용범기사 모아보기 전 부위원장 이후 두 번째다. 형식보다 실무 능력과 성과가 우선임을 방증한다.
김용범기사 모아보기 전 부위원장 이후 두 번째다. 형식보다 실무 능력과 성과가 우선임을 방증한다.권 부위원장의 업무 스타일은 단호하지만 목표는 분명하다.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다. 중소금융과장·은행과장 시절에는 무분별한 관행을 바로잡는 ‘규제의 화신’으로, 금융혁신기획단장 시절에는 과감한 완화로 ‘핀테크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었다. 혁신을 밀어붙이면서도 필요할 때는 규제를 서슴없이 적용하는, 그래서 ‘두 얼굴의 해결사’라는 평가가 따른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위기 대응에서도 그의 추진력은 빛났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선제 조치로 큰불을 막았고, 새마을금고 뱅크런 때는 “책임은 내가 진다”는 발언으로 시장 심리를 안정시켰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구조조정 등 굵직한 사건에서도 충격을 흡수하며 시스템 리스크 확산을 차단했다.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실 사무관으로 위기 대응 경험을 쌓은 것도 든든한 자산이다.
소통 능력도 뛰어나다. 금융 정책은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그는 핵심과 한계를 간단 명료하게 짚는다. 이해관계자와 언론을 상대로 메시지 순서와 타이밍을 조절하는 능력도 탁월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납득’을 이끌어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실행을 매끄럽게 만드는 설득력이 그의 강점이다.
최근 권대영 부위원장을 설명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마이크로 디자인’이다. 대통령이 큰 방향을 제시하면,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설계로 연결한다. 대표 사례가 ‘이자 부담 완화’다. “앱 몇 번으로 대출을 갈아타게 하자”는 생각은 그의 손을 거쳐 대환대출 인프라, 예대금리차·수수료 비교 시스템, 금리 산정 기준 표준화로 이어졌다.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균형점을 찾는 접근이었다. 대통령의 공개적 치하로 이어진 것도 자연스러운 결과다.
물론 우려도 있다. 작은 조정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 개입이 금융사의 자율성을 훼손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출 규제 완화나 PF 구조조정 같은 민감 영역에서는 쏠림과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추진력과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가 큰 만큼, 정밀한 설계와 안전장치도 필수다. 혁신과 안전망 사이 간극을 줄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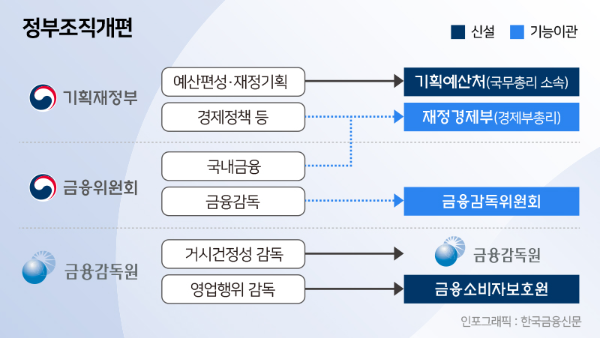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고전의 구절, 수어지교(水魚之交)가 떠오른다. 물이 맑아야 물고기가 헤엄친다. 민생이라는 물이 흐려지면 정책이라는 물고기도 방향을 잃는다. 대통령의 큰 그림과 설계자의 섬세함이 함께 작동한다면, 한국 금융은 더 공정하고, 안전하며,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진영을 넘어 능력으로 인정받은 그가 이재명 정부의 ‘히든카드’를 넘어,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의석 한국금융신문 기자 es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김의석의 단상] 진영을 넘어선 실력… 권대영의 부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90914501002140fa40c3505512411124362.jpg&nmt=18)


![30조 엔의 예산, 1.8조 엔의 시늉: ‘호송선단 방식’에 가로막힌 미완의 위기 대응 [김성민의 일본 위기 딥리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84&h=214&m=5&simg=2025031321473103554c1c16452b012411124362.jpg&nmt=18)
![20代의 고민, 나는 이 회사에서 임원이 될 수 있을까? [홍석환의 커리어 멘토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84&h=214&m=5&simg=2026020321163702470c1c16452b012411124362.jpg&nmt=18)
![[김의석의 단상] 고군분투 IBK 수장, 장민영의 지난한 100m](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84&h=214&m=5&simg=2026021215233708473fa40c3505512411124362.jpg&nmt=18)
![[기자수첩] 금융 지배구조 개선 요구, 불편한 '이중잣대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84&h=214&m=5&simg=2026020823352308571dd55077bc221924192196.jpg&nmt=18)
![[데스크 칼럼] 구본준의 ‘반도체 꿈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84&h=214&m=5&simg=2026020823315604228dd55077bc221924192196.jpg&nmt=18)

![[김의석의 단상]양종희·진옥동 회장은 왜 전주로 향했나](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84&h=214&m=5&simg=2026020617281403522c1c16452b012411124362.jpg&nmt=18)
![[김의석의 단상] 고군분투 IBK 수장, 장민영의 지난한 100m](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21215233708473fa40c3505512411124362.jpg&nmt=18)
![[데스크 칼럼] 구본준의 ‘반도체 꿈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20823315604228dd55077bc221924192196.jpg&nmt=18)

![20代의 고민, 나는 이 회사에서 임원이 될 수 있을까? [홍석환의 커리어 멘토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20321163702470c1c16452b012411124362.jpg&nmt=18)
![30조 엔의 예산, 1.8조 엔의 시늉: ‘호송선단 방식’에 가로막힌 미완의 위기 대응 [김성민의 일본 위기 딥리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031321473103554c1c16452b012411124362.jpg&nmt=18)